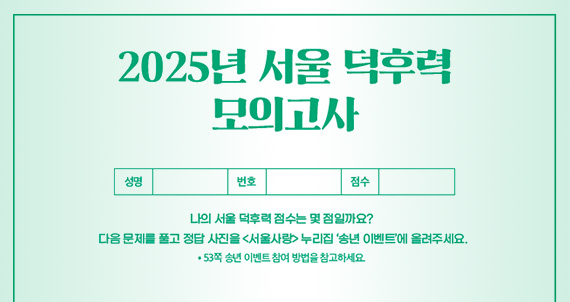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각별한 한가위
음성·문자 지원
조용하게 지내는 중추지월(仲秋之月)
이제는 추석 음식을 예전처럼 차리는 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다. 작년에도 코로나19 시국이었는데, 고향 방문은 자제하더라도 음식을 차리고 차례를 올리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일이라도 놓고 전도 부쳤다. 제사와 차례는 지내는 사람의 성의라고 했으니, 가짓수는 이제 연연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귀신’은 사실 모르는 것이 없는 존재라 후손의 무성의를 금세 알아채겠지만.
추석은 ‘풋추석’과 ‘익은 추석’으로 나뉜다. 양력 8월에 있으면 풋추석이고, 9월에 있으면 익은 추석이다. 8월이나 9월 초에는 사실 추수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추석이 이르면 어른들의 시름이 컸다. 상에 올릴 게 적었던 까닭이다. 밤도 아직 파랗고, 나락도 못 베었는데 무슨 추석인가 했던 것이다. 어디서 이른 벼(조생벼)를 구해다 밥을 지어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소한 기름내 가득한 명절의 대명사
이렇게 계절을 타는 차례상 품목이 아닌 게 있으니, 바로 전이다. 추석 하면 전부터 떠올릴 정도다. 한쪽에서는 송편을 빚고 다른 쪽에서는 전을 부쳐야 추석다웠다. 송편은 솜씨인 반면, 전은 속도전이었다. 다른 제수는 몰라도 전은 실제 먹는 양이 많다. 상에 올릴 양만 달랑(예들 들어 생밤을 칠 때 나눠 먹을 양까지 치는 경우는 드물다) 부칠 수 없는 법이다. 옛날엔 아마도 1000년은 되었을 전통도구인 번철을 놓고 부쳤겠다(번철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을 정도다). 아니면 가마솥 뚜껑을 엎어놓고 부쳤거나. 예전에는 기름이 비싸서 기름 묻힌 헝겊으로 한두 번 쓱 문지르고 부쳤다. 기름이 적으니 전이 바삭하지 않고 촉촉했으며, 부치는 기술도 더 필요했다. 기름을 많이 붓고 전을 부치면 사실 어지간하면 다 맛있다. 하지만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올릴 전은 일부러 기름을 적게 넣고 부치는 집도 있다. 제사나 차례는 옛 방식을 제대로 지켜 지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렇게 해야 올바르다는 옛 어른들의 일반 원칙이랄까.
산적은 지져두면 차례를 지내는 동안 급격하게 굳는다. 안 그래도 질긴데, 빨리 안 먹으니 굳어버린다. 귀신은 덜익어 피가 배어난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덜 익혀 상에 올리는 전통이 전해오는데(고대 제사에서 희생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던 관습을 떠올려보라), 솔직히 후손이 맛있게 먹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완전히 익힌 산적은 나중에 딱딱해지니까. 그래도 핏기 있게 살짝 익혀서 올리면 나중에 음복할 때 훨씬 부드러우니까. 아닌가?

박찬일 셰프의 소 내장 잡채 짜글이와 소고기산적 비빔밥 요리.
명절 음식의 익숙한 변주
산적과 전은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나는 며칠 지나 냉장고를 털어서 먹을 때가 훨씬 좋다. 보통 이런 걸 두루치기라고 하는데, 기름진 음식이 많이 들어가니 맛도 아주 좋고 ‘잡탕찌개’ 같은 맛이 나서 제사나 차례 당일보다 아예 며칠 후 이 두루치기를 더 기다리곤 했다. 뭐니 뭐니 해도 전이 으뜸이었다. 전은 이미 한번 부쳐서 기름을 먹은 상태다. 그것을 국물에 넣어 끓이면 먹기 좋게 풀어지는데, 기름기와 밀가루옷이 두루치기에 적당한 윤기와 농도를 보장했다. 보글보글 끓이는 두루치기는 전이 생명이다. 전이 없으면 사서라도 넣고 끓이는 것을 추천한다.
전 외에 중요한 음식이 하나 더 있다. 차례상에 올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식구가 많은 집이나 명절에 가족들이 좋아하는 잡채다. 잡채는 막 만들었을 때도 맛있지만, 식은 것을 다시 볶아도 맛있는 전형적인 음식이다. 잡채로 볶음밥을 해도 좋고, 두루치기에 넣어도 기막히다. 나는 나중에 잡채를 넣은 두루치기 메뉴를 개발해 아예 식당에서 정식으로 선보일 생각이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 두루치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짜글이’를 개발해봤다. 짜글이는 주로 김치찌개나 두부찌개 같은 것을 국물이 바특해지도록 졸이는 방식을 말한다. 훨씬 자극이 강하고, 맵고 짜다. 국물도 걸쭉해서 진하다. 짜글이에 다대기(다진 양념)를 넉넉히 풀고, 여기에 마늘과 고추장을 풀면 기막힌 음식이 된다. 이번에 고안한 짜글이에는 소내장을 넣어봤다. 옛날 음식에는 소 내장을 아주 많이 썼다. 간납 같은 간 부침 요리는 궁중 잔치에서도 먹었고, 양(소 위)·곱창 등도 왕가와 부잣집의 중요한 요리였다. 여기에서 착안해 짜글이에 넣어보니 아주 맛이 좋았다. 서울시민이 처음 맛보는 요리일 것 같다.
또 하나, 추석 차례를 지내고 흔하게 먹는 것이 비빔밥이다. 오죽하면 아직도 오리무중인 비빔밥이 제사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할까. 경상도 북부 내륙 지방에는 ‘헛제삿밥’이라는 것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걸 파는 식당이 생겨났을 정도다. 제사 때 먹는 밥이 얼마나 각별하게 맛있었으면 그러겠는가. 헛제삿밥은 대개 고추장 대신 간장 양념에 비벼 먹는다. 이번에는 좀 화려하게 만들었다. 고추장도 넣고 마늘과 간장이 주가 되는 양념장을 사용해 고명으로 올린 소고기 산적에 맞게 만들었다. 산적은 차례용에서 살짝 더 익혀 밥 위에 얹어 비벼 먹는 방식이다. 흔하게 상에 올라가는 삶은 달걀도 같이 썼다.
올해 추석은 다들 각별할 것이다. 또 모이지 못하는 식구가 많다. 방역 수칙상 가급적 모이지 않는 것이 미덕이자 시민 정신이 된 두 번째 추석 차례다. 아쉽다. 그럼에도 이겨내고 모두 모이는 추석을 위해 힘을 낼 수 있기를.

박찬일
1966년 서울 출생. <백년식당>, <노포의 장사법> 등의 책을 쓰며 ‘글 잘 쓰는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울이 사랑하는 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내 널리 알리면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박찬일 셰프의 집콕 레시피

산적을 올린 비빔밥
재료(4인분)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린 산적 2장, 미나리 3줄기(옵션 : 삶은 콩나물이나 볶은 무나물), 밥 4공기
비빔장 재료 참기름 2큰술, 진간장 8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고추장 4큰술
① 먼저 비빔장을 만든다. 볼에 모든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② 산적은 새끼손가락 크기와 굵기로 썰고, 미나리는 잘게 썬다.
③ 그릇에 밥을 담고 산적과 미나리를 올린 후 비빔장을 넣어 비벼 먹는다. 여기에 콩나물이나 무나물(옵션 참조), 약간의 김치, 김 가루를 넣어도 된다.

두루치기 스타일의 짜글이
재료(4인분)
전유어(동태전이나 대구전) 15개 내외, 잡채 1~1과1/2공기(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을 다 빨아들인다), 소 내장 삶은 것 1공기, 고추장 4큰술, 고춧가루 1큰술, 토마토케첩 1/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신 김치 다진 것 3큰술, 소고기 육수나 소고기 탕국(갱) 남은 국물 4컵(멸치 육수도 가능), 참기름 1작은술, 액젓 1작은술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어 푹 끓인 다음 농도를 잘 조절해서 낸다. 뜨거울 때 밥에 비비듯 먹으면 더 맛있다.
글 박찬일 사진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