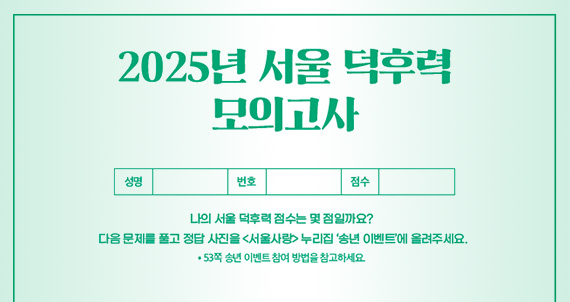여름을 나려면 기력 보충이 필요하지!
음성·문자 지원
더위에 지친 그대를 위한 복달임 한 그릇
매년 7~8월에 삼복(三伏)이 있다. 삼세번, 발이 셋인 삼발이처럼 균형이 딱 맞는 정립(鼎立)인 걸까. 세 번만 참으면 이 여름이 간다는 선언 같다. 위로일지도 모른다. 중복 무렵이면 벌써 매미의 합창이 서울 곳곳을 흔든다. 아파트 고층은 모르지만 낮은 층에서는, 일반 주택에서는 새벽잠이 깨기도 한다. 근처에 나무가 많다면 더하다. 아, 여름이 가는 것인가. 그러나 코로나19는 딱 세 번만 꾹 참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요즘 사람들의 심경이다. 세 번의 깊은 충격이 1년 반이 넘도록 우리의 시간과 일상을 빼앗아갔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 견뎌가는 자세로 우리는 적응 중이다. ‘사람은 살게 마련이다’라고 생각하려니 부아도 치밀지만.
누이가 재주를 부렸던 육개장
그런 여름날, 동네 어귀에 모기향 냄새가 나고 그 아련한 현기증과 더운 습기가 덮쳐오는 밤이면 코에 구수한 향이 슬쩍 스치곤 했다. 아, 어느 집이 닭을 잡았구나. 양은솥에 큰 닭을 삶으면서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겠구나. 삐걱거리는 마루에 앉아 백숙을 먹는 날이었다. 우리 집에서도 종종 닭을 삶았다. 아버지가 시장 닭전에 가서 크고 아름다운, 꼭 암탉으로 골랐다. 그때는 노천에서 닭을 사고팔던 때였다. 백숙을 하면 큰 쟁반에 놓고 뜯었다. 뜨거워서 아버지의 손을 타 죽죽 찢어져야 우리들 입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내일도 일찍 일 나가시겠지. 그러면 누이는 남은 백숙으로 기막힌 육개장을 끓였다. 복달임은 아예 차가운 수박도 한자리 하지만, 보신이 되어야 제격이었으니 무언가 부엌에서 뜨거운 것을 삶고 끓였다. 육개장은 가게 메뉴가 되면서 이제는 사철 사 먹지만, 본디 여름 나기의 탕으로 힘을 썼다.
닭으로 그냥 육개장을 끓이지는 않았다. 꽤나 알뜰한 방법인데, 백숙으로 하루 저녁을 넉넉히 먹고 남은 잔해(?)를 육개장으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백숙을 하면 뼈와 연골, 먹다 남은 가슴살, 기름기 많은 껍질 같은 게 뽀얀 육수와 함께 좀 남게 마련이었다. 그때 닭은 어지간히 컸다. 그러니 뼈도 야물어서 국물이 깊었다. 조미료 한 톨 안 치고 소금만 조금 넣어도 맛이 혀를 휘감았다.
누이의 육개장은 이렇다. 닭의 살을 추려 찢어놓는다. 육개장 양지머리 찢듯 흉내 내서. 껍질이며 뼈도 따로 추린다. 국물을 내려 보관한다. 그러고는 고추기름을 낸다. 고추기름에 마늘 다진 것과 대파를 넉넉히 넣어 슬쩍 볶은 후 육수와 추려둔 것을 넣어 푹 끓이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한 번 더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보는 식이었다. 그때 나는 초등학생이었지만, 누이가 만드는 육개장을 얼추 기억하고 있는 게 신기하다. 요리가 점점 진화해서 나중엔 자작하게 남은 육개장 국물에 참기름 뿌려 밥도 볶아 먹었다. 그렇게 여름을 넘겼다. 그때의 여름은 무심하게 복달임 한두 번 하고 넘기곤 했다. 여름이니까 으레 더웠고, 에어컨도 없이 그냥 났다. 지금이 더 더운 것일까? 아니면 도시가 열섬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 여름이 더 수다스럽고, 피곤하고, 힘들다. 올여름은 감염병 때문인지 더 그런 것 같다.

박찬일 셰프의 가지 라사냐와 닭 육개장 요리.
여름 감자 그리고 가지
여름은 감자다. 감자 말이 나왔으니 잊지 못할 여름 별미를 더 소개하고 싶다. 감자 상추쌈이다. 우리 민족의 대표 음식을 들라면 뭐가 있을까. 갈비? 불고기? 그것도 좋지만 고기는 귀해서 일상 음식은 아니었다. 일상 음식 중에는 쌈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쌈은 민족음식이었다. 푸성귀와 장만 있으면 거친 밥도 넘길 수 있어 효율적인 식사법이었겠다. 더구나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감자 상추쌈은 순전히 내가 고등학생 무렵에 개발한 요리(?)다. 어머니가 삶아둔 감자(그 시절엔 채반 위에 놓인 삶은 감자가 보통 가정의 여름 풍경 소품이었다)를 먹는데, 소금 말고 더 맛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했다. 찬장에 상추와 쌈장이 있기에 꾀를 낸 것이 감자 상추쌈이었다. 먼저 감자를 으깬다. 그냥 상추에 싸면 입에서 겉돈다. 찬밥이나 보리밥이 있으면 으깬 감자랑 섞기도 했다. 상추에 얹고 쌈장을 넉넉하게 발라 입이 미어지게 먹었다. 꿀맛이란 이걸 두고 하는 말이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 감자도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든, 분이 많이 나는 감자였다. 쌈장에는 다진 마늘과 매운 풋고추를 송송 썰어 넣어야 제맛이었고.
여름은 냉국의 계절이기도 했다. 뜨거운 육개장 아니면 찬것이 복달임의 묘수였다. 제철 재료가 냉국이 되었다. 오이며 가지가 주종이었다. 입맛 돋우느라 식초가 한몫을 했다. 그중에서도 가지는 어른의 음식이다. 치아에서 미끄러지는 가지 껍질, 뭉클하게 녹아 이상한 가지가 맛있게 여겨지면 ‘아, 어른이 되었어’ 하고 믿어도 된다. 미끈한 가지의 뭉클뭉클한 속은 한없이 부드럽고 달게 느껴진다. 특히 이탈리아는 가지를 좋아하기로 세계 일등 국가다. 초여름부터 시장에 둥근 가지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우리나라의 길쭉한 가지와 달리 이탈리아 가지는 거의 공처럼 둥글고 크다. 두툼하게 썰어서 구우면 꼭 고기 같다. 이 가지는 굽거나 오븐에 익힌다. 토마토소스와 잘 어울리는 서민의 요리다. 값은 싸고 맛은 좋은. 올여름의 끝자락, 닭 육개장과 가지 요리로 나보는 건 어떨지. 아, 여름은 아직 길다.

박찬일
1966년 서울 출생. <백년식당>, <노포의 장사법> 등의 책을 쓰며 ‘글 잘 쓰는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울이 사랑하는 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내 널리 알리면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박찬일 셰프의 집콕 레시피

닭 육개장
재료(4인분)
닭 1마리(10호 이상의 큰 것), 고운 고춧가루 1큰술, 굵은 고춧가루 2큰술, 대파 6대(5cm 길이로 썰어둔다), 소주 1잔, 다진 마늘·식용유 4큰술씩, 부추 적당량, 소금·후춧가루·국간장 2큰술씩
① 닭은 껍질을 제거하고 소금을 조금 쳐서 푹 삶는다. 닭이 다 익으면 20분 정도 중간 불에 더 삶은 후 가볍게 식혀서 살을 뜯어놓는다. 뼈는 따로 추려 국물에 넣고 20분 더 끓여 육수를 낸다.
② 제거한 닭 껍질을 냄비에 넣고 천천히 불을 가열해 기름을 뺀다. 그런 다음 식용유와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약한 불에 천천히 볶다가 발갛게 색이 나면 멈춘다.
③ ②에 다진 마늘 절반과 굵게 썬 파를 넣어 가볍게 볶는다. 소주를 붓고 휘발되면 육수를 붓고 찢어둔 고기를 넣는다. 5~6분간 팔팔 끓이다 소금, 국간장으로 간한다. 남은 다진 마늘을 넣고 1분간 더 끓인 후 후춧가루, 부추를 뿌려 낸다.

가지 라사냐
재료(4인분)
가지 10개, 올리브유 5큰술, 다진 마늘 2큰술, 토마토소스(시판용) 500g, 모차렐라 치즈(피자용) 600g, 파르메산 치즈 가루 80g,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① 가지는 1cm 두께로 길게 자른다. 큰 팬에 기름 없이 소금·후춧가루 약간 뿌린 뒤 굽는다. 다른 팬에 올리브유 절반과 토마토소스, 다진 마늘을 넣어 뜨겁게 한 번 데워둔다.
② 우묵한 도기 그릇이나 오븐 팬에 기름을 살짝 바른 후 가지-토마토소스-모차렐라 치즈-파르메산 치즈 순으로 쌓는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토마토소스를 조금 남겨 위에 뿌린다.
③ 200℃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굽는다. 칼로 잘라 접시에 담고 파르메산 치즈 가루를 뿌려 장식한다.
글 박찬일 사진 양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