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술집과 대폿집, 막걸리 마시는 소리
음성·문자 지원
“술술 넘어가니 술이다.” 이는 웃자고 하는 말이다. 술이란 수(水)와 불(火)을 합친 수불에서 비롯되었다.
술이 익을 때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는 것이 마치 물에서 불이 난 듯하다고 해서 수불이라고 했단다.
수불→수블→수울→술. 이렇게 바뀌어왔다. 술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술술 넘어가는 술?
“태초에 술이 있었다”는 말처럼 술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술이란 어색한 침묵의 순간을 매끈하게이어주는 윤활제가 된다. 때로 술은 그동안 잊고 지낸 묵직한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애주가인 나는 “술을 마음껏 마시되, 물로써 넉넉히 깰 만큼 마셔라”는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산다. “신은 물을 만들고 인간은 술을 빚었다”는 말을 떠올리며 술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힘쓴다. 그러나 술이 술을 먹기도 하니 때때로 술은 몹쓸 기호품이 되기도 한다.
내 친구 한 명은 체질에 맞지 않아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 술 한번 맘 편히 먹고 속에 쌓인 응어리를 풀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막걸리집에서 얼큰하게 취해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렇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 한잔이야말로 다시없는 위안이요 오락이고 강심제요 활력소가 된다. ‘허름한 막걸리집’, 예전에 그 집을 일컬어 선술집이라 했다. 때로는 대폿집이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선술집이고 대폿집일까? 그 둘은 무엇이 다를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민중주당’이 선술집 술값을 2전 올리면 술 먹기 힘들겠다고 풍자한 만화. 1924년 동아일보에 실렸다.
경성의 명물 선술집
김홍도가 그린 주막을 누구나 기억한다. 사극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곳으로 주막을 자주 등장시킨다. 옛 주막은 손님에게 술과 밥을 팔았으며,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다. 이 주막이 선술집으로 바뀌었을까? 선술집이란 서서 먹는 술집이다. 좌식 문화가 뿌리 깊은 이 땅에서 무슨 까닭으로 서서 먹는 술집이 생겼을까?
많은 사람이 혼동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선술집이 허름한 것은 맞지만, 허름한 술집 모두가 선술집은 아니다. 반드시 서서 마셔야 선술집이다. 본디 서울에는 선술집이 없었지만, 18세기 초 청나라의 영향으로 생겨났다는 설, 내외주점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설, 일제강점기에 나타났다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모두 정확하지 않다. 선술집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선술집이 일제강점기에 ‘경성의 명물’인 것만은 틀림없다. 1929년 무렵만 해도 개성이나 수원, 인천, 춘천 같은 몇몇 도시에만 선술집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연회장이며 사교장”이 바로 선술집이다. “체면은 걷어치우고 별의별 놈팡이들이 뒤섞여 왁자지껄 떠들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다. 선술집은 한 잔 술에 안주 하나를 곁들여 5전씩 받았다. 5전이라고 하면 종로에서 남대문까지 가는 전차 삯이었고, 가난한 사람이 피우던 ‘마코’ 담배 한 갑 가격이었으며, 우동 한 그릇 값이었다. 안주를 거저 준다고 해서 얕잡아보면 큰코다친다. 선술집 안주와 음식은 뭇사람에게 호평을 받았다.
“음식집치고는 가장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안주를 소담스럽게 괴어놓은 것은 누구나 비위가 동하고 좋게 보았다.” 목로술집, 즉 선술집을 즐겨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주 때문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너비아니와 갈비까지 있었다. 큰 솥에서는 추어탕, 선짓국, 갈빗국 등이 펄펄 끓었다. 선술집은 술을 팔되 안주만으로도 간이 음식점 역할을 하고도 남았다. 선술집은 여러 가지 안주를 갖추었지만, 특색 있는 안주만 전문으로 하는 집도 있었다. 보기를 들어 빈대떡이 주요 메뉴라면 아예 선술집 이름을 ‘빈대떡집’이라고 짓기도 했다. 선술집은 저마다 특색이 있어서 한 번에 네댓 군데를 돌아다니며 마시기도 했다.
요즈음 옛 정취를 지닌 간이주점을 흔히 대폿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본디 대폿집이란 ‘서서 먹는 선술집’ 가운데 안주가 없는 술집이었다. 포(匏)란 표주박이다. 따라서 대폿집이라고 하면 큰 그릇에 막걸리를 가득 담아 벌컥벌컥 마시는 술집이다. 안주도 주지 않는데 왜 대폿집을 갔을까? 대폿집은 안주가 없는 대신 술을 갑절이나 더 주었고 술맛도 좋았다. “5전 한 푼 던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김치한 쪽 씹으며 나가서 지게 품을 파는 패들이 들끓는 곳”, 바로 그곳이 대폿집이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다 하는 술꾼은 대폿집에 가서 열 잔 스무 잔씩 마시기도 했다.

2전 더 받지는 않지만 ‘술이 눈에도 안 보이게’ 줄었다는 내용의 만화가 9일 뒤에 같은 신문에 실렸다.
비지전골과 경성의 소리
선술집이나 대폿집마저 갈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모줏집을 찾았다. 모주란 막걸리를 걸러내고 그 술찌끼를 다시 우려서 걸러낸 술이다. 모주는 한 잔에 2전이고 안주는 비지전골이다. 술꾼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 “비지전골이 끓었소!”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막벌이꾼이나 행랑아범 등이 왔다. 시장 부근의 골목골목에도 비지전골집이 있었다. 이곳은 새벽일을 나온 사람과 아침 해장거리를 찾는 지게꾼이 주로 이용했다.
왜 난데없이 술타령인가. 선술집과 대폿집에서 흘러나오는 막걸리 마시는 소리, 그들이 한숨처럼 토해내는 카~ 소리, 술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역사의 내면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였다.
최규진 수석 연구원은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한국 근현대 일상생활사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 <쟁점 한국사-근대편>, <제국의 권력과 식민의 지식> 등 다양한 저서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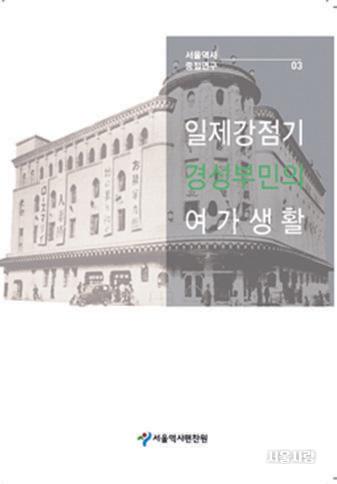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
서울역사편찬원 펴냄 / 1만원
일제강점기 지배의 어둠 속에서도 당시 서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여가 생활을 향유했는지 유형별로 조명하는 연구서다. 당시 영화 관람과 영화 산업부터 여름철 여가 활동인수영과 수영장, 외식 문화의 형성 등 7개 주제를 다룬다.책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서울책방 또는서울책방 홈페이지(store.seoul.go.kr)에서구매가 가능하다.
글 최규진(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서울역사편찬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