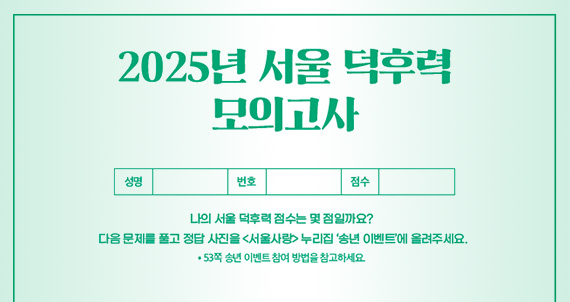전당포에 잡힌 물건
음성·문자 지원
인정 많은 시골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많더라도 전당포가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담 하나를 떨어져 살면서 그 집 주인이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려 하지도 않는 도시에서만 전당포의 효력이 컸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당포를 도시의 빈민 은행이라 부르곤 했다.
사물, 물건이 만든 사건들
요즈음 나는 사물(事物)이라는 언어를 새롭게 붙들고 있다. 사물을 곧이곧대로 풀어 쓰면 ‘사건을 일으키는 물건’이다. 모든 물건은 새로운 욕망을 부추기거나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있다. ‘기억하지 않아도 잊히지 않는’ 아픔과 이제 막 딱지가 앉은 상처, 그 밖의 모든 사건은 내 삶에 흔적을 남긴다. 물건도 그렇다.
젊은 시절, 내게 손목시계는 중요했다. 내 물건 가운데 가장 비싸서도 아니고, 내 시간을 규율하고 감독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그 손목시계는 비상금이나 마찬가지였다. 갓 성인이 되어 어른 흉내를 내던 때, 몇 푼씩 돈을 모아 막걸리를 사 마시곤 했지만 돈도 술도 늘 모자랐다. 쫓겨나듯 막걸리집을 나오면 군데군데 호프집이 눈에 들어왔다. 돈은 없고 목은 탔다. 그때마다 눈에 박히는 간판이 바로 전당포였다. 내 손목시계는 몇 번이고 호프를 위해 전당포 포로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전당포에 넘겨버린 손목시계가 꽤 된다. 이런 추억은 나이 지긋한 분이라면 누구나 다 있을 것이다.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에게 여자가 “피~ 나프탈렌 냄새”라고 말한다. 양복을 전당포에 맡겼었음을 알아차렸다.(<신여성> 1931년 11월호)
식민지 경성, 집마다 전당포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전당표 없는 집은 흉가”라는 서울식 속담이 유행했다. 서울 어느 집이나 전당표 하나둘쯤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1897년 서울에 전당포가 200개 남짓 있었으니 전당포는 서울 사람에게 이미 익숙했다. 개항 뒤 전당업이 전문 직업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지만, ‘전당(典當)’이라는 말의 기원은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사서 <삼국지> ‘후한서’에는 다른 나라 사람을 인질로 잡아두는 것을 ‘전당’이라고 했다. 고려 시대 사서 <고려사> ‘공민왕’ 편에는 부자가 쌀을 빌려주고 복리로 이자를 받아내려 하자, 가난한 사람이 이를 갚지 못하고 그 대신 자녀를 ‘전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세월이 지나 인질은 ‘질(質)’이라 일컫고, 물건 맡아두는 것은 ‘전당’(典當)이라고 했다. 조선 시대 말기에 이르면 상공업과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토지 사유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전당물로 잡고 대부하는 전당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당포 또는 전당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를 전업으로 삼은 사람이 생긴 것은 개항 뒤의 일이다. 일본 사람이 그 일에 앞장섰다. 이 무렵 일본 사람은 상점을 운영하면서 전당포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서는 물건 따위를 잡고 돈 빌려주는 곳을 ‘질옥’이라고 했고, 조선에서는 전당포라 했다.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너 나 할 것 없이 전당포나 고리대금업을 했다. 장사가 잘되는 질옥을 본 조선 사람도 앞다투어 전당포 문을 열었다. 전당포는 이자가 매우 높았다. 중국보다 거의 곱절이나 되었으며, 일본보다도 비쌌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있으면 밉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전당포였다. 자식들 수학 여행비나 운동회 때 입고 갈 운동복을 장만하려고 전당포를 찾는 어머니, 밥 지을 쌀이 한 톨도 없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밥그릇을 치마에 감추고 가는 노동자의 아낙네, 빚에 쪼들려 가게 물건을 들고 가는 소상인, 시골서 옛 친구가 찾아오면 집에 있던 시계를 떼어 들고 남이 볼세라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전당포로 뛰어가는 월급쟁이의 가엾은 처지…. 이것이 서울 사람의 뒷모습이다.

더는 맡길 옷이 없어 마지막 남은 ‘싱거’ 재봉틀을 110원에 전당국에 저당 잡힌다. 한용운 소설 <박명>의 삽화(조선일보 1938년 12월 10일)

가난한 월급쟁이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매일신보 1930년 2월 23일)
세월따라 물건 따라
돈에 쪼들린 사람이 남의 눈길 피하며 전당포에 들고 온 물건은 무엇일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910~1920년대 초반에도 옷가지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비녀, 귀이개, 그릇, 세간 따위였다. 일본인 전당포와 달리 조선인 전당포에는 놋그릇이 많았다. 1920년대 중반에는 어땠을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다. 그 무렵 잡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이렇다.
경성 북촌 중앙인 삼청동(三淸洞)에서부터 권농동(勸農洞)까지는 전날 양반집에서 쓰던 세간 따위, 학생용품, 서적, 가정부인들의 값나가는 의복·패물 따위가 많았다. 청진동(淸進洞) 다방골 근처 기생 많은 곳에서는 그야말로 값나가는 능라금수의 치마저고리, 금은보배의 비녀·반지·노리개 같은, 보드라운 살에서 연지 냄새와 향유 냄새에 절어 나온 물건이 뒹굴어 들어온다. 서대문 밖 독립문 근처로부터 애오개고개로 해서 남대문 밖 정거장 건너 봉래정(蓬萊町) 일대까지는 박봉 월급쟁이와 막벌이 노동자들의 값싼 물건이 볼모로 잡혀 전당포 창고 안에서 징역을 살았다. 다른 글에서는 여성의 월경대나 속옷을 전당 잡히는 일도 있었다고 전한다. 정월 첫날에 여성용품을 전당 잡으면 그해에 재수가 좋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여자들이 이용했단다.
옷을 전당 잡히면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철 지난 옷을 맡겼기 때문이다. 겨울 솜옷을 잡히고 봄날의 주린 배를 채우는 식이었다. 그러나 조선 옷은 전당포에서 아주 낮게 잡아주었다. 20원쯤 하는 옷이라도 1~2원에 지나지 않았다. 1930년대 양복과 양장의 시대가 열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전당포에서는 옷에 좀이 슬지 않도록 나프탈렌을 넣었다. 그래서 전당포에 맡긴 옷에서는 나프탈렌 냄새가 났다. 따라서 ‘전당포의 서울은 나프탈렌의 서울’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전당포는 있다는데, 어떤 물건을 전당 잡아주는지 알지 못하는 나는 행운아일까. 그러나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사물에 내 삶이 전당 잡힌 듯한 느낌이 든다. ‘전당’이라는 언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볼 일이다.

봄이 되니 겨울 외투를 전당포에 맡긴다. 전당포를 ‘일육은행’이라는 은어로 불렀음을 보여준다. (매일신보 1934년 3월 26일)
최규진 수석 연구원은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한국 근현대 일상생활사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 <쟁점 한국사-근대편>, <제국의 권력과 식민의 지식> 등 다양한 저서를 출간했다.
글 최규진(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 연구원)